갯벌하면 사람들은 순천을 떠올린다. 끝없이 펼쳐진 순천만 갈대밭은 순천만 정원과 더불어 순천을 먹여살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순천만 정원은 과도하게 찾아드는 관광객으로부터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완충 지대다. 순천만 정원을 돌아보면 갯벌을 지키기 위한 순천 사람들의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된다.
태안을 중심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서해안을 빼고 갯벌을 이야기 할 수는 없다, 순천만처럼 눈으로 즐기는 재미가 쏠쏠한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광활하게 펼져지는 규모 앞에서 압도 당하고 만다. 그런데 경남 사천 갯벌이 유명하다는 것은 정작 경남 사람들도 잘 모른다.
종포와 대포를 이어주는 해안길은 산책로로 다듬어져 아름아름 찾는 이들이 많다. 날씨와 물 때가 맞아떨어지는 해거름이면 노을에 잠긴 갯벌은 장관을 이룬다. 세 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도착했을 때는 점점 물이 빠지고 있었다. 평일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의 발길이 그리 붐비지는 않는다. 눈 앞에 펼쳐진 갯벌을 두고 사천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일행들이 입을 모은다.
어린 꼬마가 갯벌에서 놀다 수돗가로 와 홀딱 벗은 몸을 씻고 있다. 멀리 갯잔디 사이로 드문드문 사람들이 눈에 담긴다. 사람들이 살았던 곳 어디에나 그들이 남긴 역사가 있기 마련이다. 갯벌도 마찬가지다. 그 안에 아로새겨져 있는 수많은 사연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 갯벌은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놀이터로 변해간다.
종포 갯벌에 대한 기억들이 내게는 참 각별하다. 늘 파도가 거친 거제도 바다만 보다가 오밀조밀한 갯벌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것은 사천이 고향인 남편과 결혼을 했을 그 무렵이었다. 다 같은 바다지만 바다의 속살이 제각각 다르다는 것을 그 때 처음으로 알았다.
근처에 시댁이 있었던 덕분에 종포 갯벌은 끼니마다 찬거리를 제공해주는 텃밭이었다. 해거름이면 시어머니는 뻘이 잔뜩 묻은 대바구니를 들고 왔다. 옴팡진 바구니 속에는 게, 고동, 낙지, 조개, 속, 등이 가득했다. 고무 다라이에다 쏟아놓으면 안에서는 이리저리 게들이 기어다니고 낙지가 꾸물거렸다.
어머니가 장만해주는 꿈틀거리는 낙지를 기름장에 찍어 코를 박고 먹었다. 지금은 손이 떨려 비싼 산낙지를 그렇게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다. 순천 남부장에서 파는 찔룩게 튀김을 무척 좋아하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찔룩게 튀김에 막걸리 생각이 간절하다.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예전에 입력된 맛에 대한 기억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속'이었다. 주홍색 껍데기 속에 탱글탱글하고 달큰한 속살은 요즘 비싼 값으로 먹어야 하는 킹크랩에 뒤지지 않았다. 조개며 낙지, 새우 등을 아깝지 않게 투척을 하고 끓인 제사 때면 으례히 만드는 탕국은 어떠랴. 그 시원한 맛이라니 지금도 소고기를 넣고 끊인 탕국에 손이 가지 않는 것은 그 때 들인 고급스런 입 맛 때문이다.
겨울이면 겨울대로 갯벌은 넉넉했다. 적당하게 파래가 섞인 김을 발에다 붙이고 햇볕에다 말리면 김에서는 물씬 갯 냄새가 났다. 장흥 무산김에 비길 바가 아니었다. 뻘에다 꽂아둔 대나무에서는 겨울이면 석화가 꽃처럼 피어났다. 통영굴보다 열 배는 작고 단단한 알에서는 진한 향이 났다. 초장에 비벼먹어도 맛이 있었고 전을 부쳐먹거나 떡국을 끓여먹여도 국물이 시원했다.
굴은 김장 김치를 담글 무렵에 값이 가장 좋았다. 그래서 그 무렵 아낙네들의 속주머니가 일 년 중에 가장 든든한 시기이기도 했다. 갯벌을 곁에 두고 사는 여자들은 갯벌을 금고라고 했다. 한나절 일을 하면 푼돈이 아쉽지 않게 생겼다. 주머니에서 인심 난다고 든든한 금고를 끼고 사는 갯가 여자들은 억척스러웠지만 통이 크고 화통했다.
갯벌은 어머니에게는 찬거리를 마련하고 푼돈을 손에 쥐어주는 그 이상의 의미였다, 어머니들은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 자신이 살아온 삶은 책 몇 권을 내고도 모자란다고. 시어머니도 마루에 걸터앉아 길게 담배 연기를 내 뿜으며 지나가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다. 고부갈등, 남편의 바람기와 노름, 가난 그런 것들은 그 시절 여자들의 삶을 괴롭힌 단골 메뉴였지 않은가.
갯벌에 나가서 뻘을 파고 헤치면 손 끝에 뭉클하고 잡히는 손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목숨 걸고 낚시를 다니는 낚시꾼들이 말하는 바로 그 손 맛을 갯벌에서도 느낄 수 있다니... 어머니는 바로 갯벌꾼이었다. "그래도 갯벌에 가면 모든 시름이 다 사라졌리라. 이것 저것 잡다보면 그 때만큼은 근심걱정도 잊히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거 그런 것은 생각도 안나고 나한테는 갯벌이 놀이터 아이었나."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들 도시로 학교도 보내고 옷도 사 입히고 고기도 사먹이고 고달픈 시름도 잊어가며 살았던 어머니의 놀이터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농공단지조성을 위해 사천만을 매립하면서부터였다. 물이 가두어져 흐름이 자유롭지 못하자 갯벌이 썩기 시작했다. 씨를 뿌려도 조개는 알이 차지 않았고 대나무를 꽃아도 더 이상 석화는 꽃을 피우지 않았다.
그 많던 사천 갯벌이 육지로 변해가고 갯벌이 갯벌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는 동안 어머니의 삶도 조금씩 사그러들어갔다. 허리가 굽어지고 걸음걸이는 느려졌다. 말 수는 줄어들고 귀는 어두워졌다. 멀리 갯벌을 파헤쳐가며 게와 고동, 조개 따위를 잡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세상은 또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살아가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버스 안에서 야동보는 점잖은 할아버지 (0) | 2016.03.04 |
|---|---|
| 부를 누릴 것인가, 이름을 남길 것인가 (0) | 2015.11.14 |
| 차의 향기는 사라져가고~ (1) | 2015.10.15 |
| 해품달, 선생님 합방이 뭐에요? (5) | 2012.02.21 |
| 진달래꽃이 피었습니다 (6) | 2011.11.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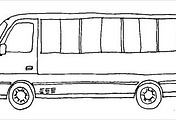


댓글